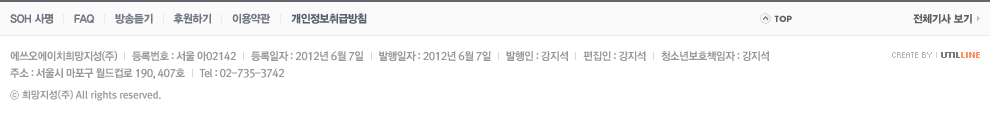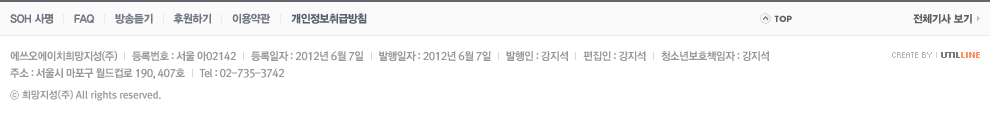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SOH] 전국시대 말기 여러 제후들이 할거해 분열되었던 국면이 진나라에 의해 통일됐다. 진시황은 재위 37년 순행을 나갔다 사구(沙丘)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진시황은 유조(遺詔)에서 장자인 부소(扶蘇)를 불러 장례를 주관케 하고 도성에 들어와 제위에 오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서를 관리하던 조고(趙高)가 승상 이사(李斯)와 결탁해 거짓 조서로 부소를 자살하게 하고 어린 아들 호해(胡亥)를 황제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진이세(秦二世)다.
진이세가 즉위 후 진시황의 옛 신하들과 황실의 종친들을 멋대로 살해하자 진시황이 심혈을 기울여 건립한 제국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이세 원년(기원전 210년)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900명의 수졸(戍卒 변방에서 수자리 하는 군사)을 인도해 가다 대택향(大澤鄉)에서 “나무를 베어 무기로 삼고(斬木爲兵) 장대를 들어 깃발로 삼으며(揭竿爲旗)” 진이세의 통치에 도전했다.
그들은 진(陳) 땅에 정권을 세우고 국호를 ‘초(楚)’ 또는 ‘장초(張楚)’라고 했다. 이를 기회로 각지에서 진나라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앞다퉈 자신의 역량을 조직하고 순식간에 군웅이 할거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마치 여러 제후들이 각축하던 전국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4. 위나라를 기습
팽성대첩 이후 항우는 유방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는 병력을 조정해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는 물론 구강왕(九江王) 영포(英布)와 협력해 남과 북에서 협공해 관중을 직접 공략하려 했다. 바로 이때 원래 유방에 예속해 있던 위나라 왕 표(豹)가 유방의 세력이 약한 것을 보고는 역심을 품고 항우와 손을 잡고 측면에서 유방을 협공하려 했다.
위왕의 영지는 하동(河東 황하 동쪽)에 위치해 서쪽으로 관중을 위협하고 남하하면 관중과 형양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다. 때문에 유방 입장에서는 항우와 결전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위왕 표를 처리해야 했다. 그는 우선 모사 역이기를 보내 좋은 말로 타일러보았다.
하지만 위왕 표는 평소 유방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극히 혐오했기 때문에 사자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역이기는 어쩔 수 없이 아무 공도 없이 되돌아왔다.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유방은 다시 한신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방은 한신을 좌승상(左丞相) 겸 대장에 임명한 후 조참, 관영 등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위왕은 황하 강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엄밀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한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황하를 건널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당시 한나라 군은 겨우 백여 척의 배만 있었는데 억지로 강을 건너자면 피해가 커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신은 ‘진선포판 목영도군(陳船蒲阪,木罌渡軍)’의 묘책을 사용했다. 즉 병력을 둘로 나눠 겉으로는 포판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처럼 했다. 관영에게 1만의 병력과 백여 척의 배를 동원해 임진관(臨晉關) 건너편에 진을 펼치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했다. 이에 위왕 표는 한나라 군대가 포판으로 건너올 것으로 여기고 곧장 기존의 배치를 움직여 다른 지역에서 많은 병마를 동원해 엄밀히 방비하게 했다.
한편 한신은 몰래 다른 병력을 움직여 북쪽으로 백리 정도 떨어진 하양(夏陽 지금의 섬서성 한성)으로 갔다. 하양나루는 용문관(龍門關)에서 포진관(蒲津關) 사이에서 가장 좋은 나루터로 물길이 넓고 흐름이 완만해 배를 띄우기 쉬웠다. 또 20리 정도 평지가 있어 군대를 집결하기에도 편리했다. 한신은 하양에 도착한 후 배를 이용하지 않고 강을 건너게 했다. 즉 각종 그릇을 동원하고 나무를 벌목 한 후 나무토막을 항아리에 끼워 끈으로 고정한 뗏목을 만들었다.
물론 이 도하작전은 상대편에 있던 적병이 포판으로 동원된 뒤에 시작되었다. 도하한 후에는 위나라 군을 놀라게 하지 않고 즉시 안읍(安邑)으로 진격해 신속하게 안읍을 점령했다.
안읍은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위왕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을 돌려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나라 군대가 포판에서 철수하자 한나라 군은 즉각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 신속하게 포판을 점령했다. 이렇게 앞뒤로 강을 건넌 한나라 군은 위왕의 대군을 포판과 안읍 양쪽에서 협공했다.
안읍성 아래에서 위나라 군이 대패한 후 도망가자 조참이 추격에 나섰다. 위나라 군이 동원(東垣)까지 도망가자 조참 역시 따라갔다. 위나라의 잔병이 전부 소멸된 후 위왕 표 역시 생포되었다. 이어서 한신은 또 북쪽을 공략해 평양(平陽)을 차지해 단번에 위나라 전역을 평정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강력했던 위나라가 소멸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양고도(夏陽古渡)를 가리켜 ‘목앵도(木罌渡 목앵이란 나무통으로 황하를 건넜다는 의미)’ 또는 ‘회음도’라 불렀다.
‘목앵도하(木罌渡河)’는 전쟁사에서 경전의 반열에 오른 작전으로 단지 강을 건넌 방식이 특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략은 더욱 기묘했다. 우선 ‘성동격서(聲東擊西)’로 동쪽을 공격하는 척 하다 서쪽을 공격한 후 다시 동쪽을 공격해 적군을 완전히 수세에 처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계획이 성공한 후에는 많이 이들이 그를 경계로 삼는다. 때문에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아주 크다. 그러나 군사기재 한신은 두 번이나 ‘암도진창(暗渡陳倉 몰래 진창을 건너다)’ 전술을 사용했으니 가히 독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신은 위나라를 평정해 측면에서의 위협을 없애고 관중의 후방을 더 공고히 다지는 한편 항우의 우익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형양에 대한 압력도 줄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신의 작전은 줄곧 병력을 깨뜨리는 것 위주이며 적의 주력을 소멸시키고 단순하게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그가 얻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아주 공고했고 다시 땅을 잃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위나라가 멸망하자 유방은 즉각 사람을 파견해 포로로 잡은 모든 위나라 정병과 획득한 대량의 물자를 전부 가져갔다. 명분은 형양전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더 중요한 원인은 한신의 실력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 (계속) 大紀元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