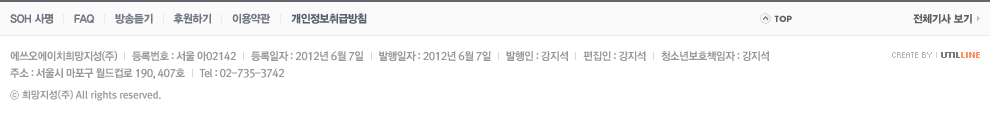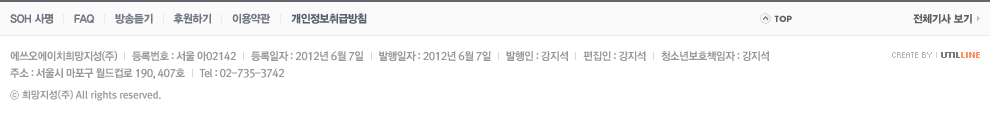글/김예영(원명학당 원장)
[SOH] 유교무류는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는 뜻으로, 곧 모든 사람을 가르쳐 이끌어 줄 뿐 가르침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선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 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논어 위령공편에서 공자는 ‘가르침이 있으면 종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주희의 설명을 보면, ‘사람의 본성은 다 선(善)한데, 사람에 따라서 선악(善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과 습관의 물들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모두 선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종류의 악함을 논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란 말은 교육의 평등성을 고취한 공자의 교육정신을 표현하는 말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융(馬融)이나 황간(黃侃) 같은 학자들은 이는 피교육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는 빈부(貧富)나 현우(賢愚, 현명하고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지역, 연령, 종족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공자의 생각을 대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공자는 호향(互鄕)이란 마을에 사는 아이가 찾아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아이를 대문 밖에서 돌려보내려 했으나 공자는 그 아이를 들어오라 해서 반갑게 맞아 주고 또 그가 묻는 말에 일일이 대답해 준 일이 있습니다.
호향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그 지방 사람과는 말도 함께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 천한 계급이나 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 아이를 만나준 데 대해 공자의 처사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공자는 이 때 제자들을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오면 그 깨끗한 마음을 받아들일 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까지 따질 것이야 있겠느냐. 그의 과거를 따지는 그런 심한 차별을 할 것 까지는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차별의식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공자는 ‘포(脯) 한 속(束) 이상을 가지고 와 집지(執贄)의 예(禮)를 행한 자에게는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을 만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찾아오면 누구든지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말이지요.
실례로 공자의 문인들을 보면 공자가 그런 차등을 두지 않고 제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유(冉有), 자공(子貢) 등은 부자였으나 안회(顔回), 원헌(原憲)은 가난했습니다. 맹의자(孟懿子)는 신분이 높았고 염옹(冉雍), 자로(子路)는 낮은 신분 출신이었습니다.
안회는 현명하였고 고시(高柴)는 우둔하였으며, 안로(顔路)는 공자보다 여섯 살 아래로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고 공손룡(公孫龍)은 공자보다 53세 아래로 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한 출신국을 보면, 자연(子淵)은 노(魯), 자하(子夏)는 위(衛), 자장(子長)은 진(陳), 자고(子羔)는 제(齊), 자개(子開)는 채(蔡), 자사(子思)는 송(宋), 자남(子南)은 진(秦), 자도(子徒)는 정(鄭)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차별없는 교육을 실천하였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오랜 전통을 깨고 교육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의 보편화에 기여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인류를 똑같이 사랑으로 대한 데서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자기 수양과 회개에 더욱 용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