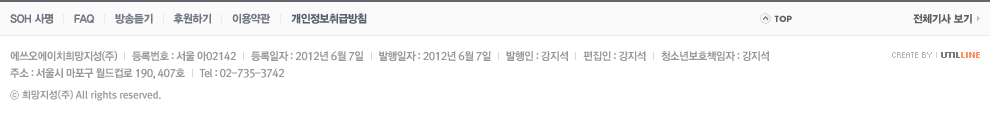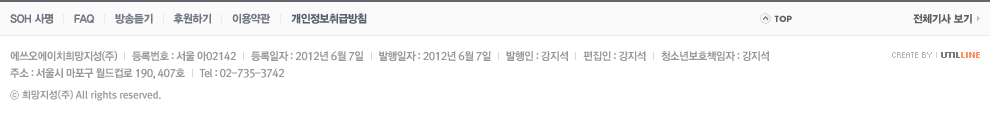글/김예영(원명학당 원장)
[SOH] 철주(掣肘)는 당길 철, 팔꿈치 주 로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팔을 잡아당긴다는 말인데 곧 남의 팔꿈치를 맘대로 쓰지 못하게 하여 일에 훼방을 놓는 일을 말합니다.
즉 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을 잡아당기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는 뜻으로 보통 불필요한 간섭, 방해되는 간섭을 가리켜 철주를 가한다고 합니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심응(審應)편’, 공자가어(孔子家語)등에 나옵니다.
이 말은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 복자천(宓子賤)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복자천은 공자제자 중 나이어린 제자였는데 공자는 그를 군자라고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노나라 애공(哀公)이 그에게 단보(亶父)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복자천은 이때 한 가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애공이 못된 신하들의 참언에 끌려 복자천 자신의 의도대로 정치를 펴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고민 끝에 복자천은 한 계책을 생각해 냈습니다.
복자천은 단보에 부임하는 길에 애공의 측근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임지에 도착하자 관리들이 모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복자천은 데리고 온 관리에게 서류를 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하자 복자천은 그 곁에서 그들의 팔꿈치를 슬쩍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여 글씨 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다 써놓은 서류를 보니 글씨가 하나같이 비뚤비뚤하고 떨린 것이 온통 엉망이었지요.
복자천은 서류를 집어 들고 글씨가 좋지 않다면서 두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둘은 곧 복자천에게 사임을 표명했고 복자천도 곧 그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애공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복자천을 위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글씨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애공이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단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애공은 설명을 다 듣고 깊이 생각하더니 크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자천이 나의 생각을 밝혀주려고 한 것이리라. 아마도 나는 복자천의 정치하는 일을 간섭하여 그가 생각한 대로 해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도다.”
애공은 곧 측근을 복자천에게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단보 땅은 내 소유가 아니요, 그대의 땅이라. 그대 뜻하는 대로 다스리기 바란다. 5년이 지나서 내 그 보고를 들으리라.”
이후로 단보의 땅은 복자천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습니다.
단보의 백성들이 살기 좋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자는 우마기(巫馬旗)라는 제자를 보내 단보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살피게 했습니다.
우마기는 밤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다시 강물에 놓아 보내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으니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자천님께서 어린 고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지 않으므로 놓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우마기는 복자천의 다스림이 훌륭하다고 감탄하고 돌아와서
“자천의 덕은 단보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미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마치 법령이 옆에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사람은 대개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그것이 못 미더워서 팔꿈치를 건드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팔꿈치를 건드려서 잘 쓸 수 있는 글씨를 오히려 망쳐버리는 수도 많지요.
철주로써 그 잘못을 지적한 복자천의 재치도 대단하지만 그 뜻을 용케 알아차린 애공의 지혜와 도량도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