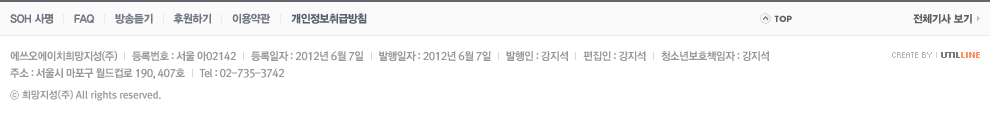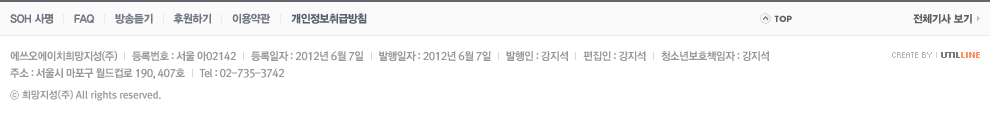작가 : 청현
[SOH] 땅의 열기가 하나, 하나/ 하늘로, 하늘로, 솟아 오르며/ 하늘에 가까운 가지 끝에 대롱거리는/ 열매들에 이르러/ 빨갛게 식어간다
모진 태풍이 수차례 쓸어가며/ 폭풍우가 폭동을 치다 지나가며/ 대지의 뿌리들을 뽑아/ 땅을 어지럽게 뒤집어 놓은/ 지난 여름의 미친 열기
이제 그 열기들이 하나, 하나/ 하늘로, 하늘로, 솟아 오르며/ 태풍을 이겨내고/ 폭풍우를 견디어 낸/ 가지, 가지, 끝에/ 하늘 가까이 대롱거리는 열매들에 이르러/ 빨갛게 식어 간다
깊은 이 정적/ 사랑하는 사람아, 이젠 만나도 좋으려나/ 열기 가신 이 계절, 이 대지 머지 않아 추석이 되면/ 밝은 그 달이 떠오르려니/ 혼자서, 혼자서.
편운(片雲) 조병화 시인의 ‘멀지 않아 추석이 되려니’라는 시다. 고향 찾아가는 귀성길에 빈부와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 귀성(歸省)은 귀향성친(歸鄕省親)의 줄인 말이니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조상의 묘소를 참배(省墓)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등 인구 이동이 자제되는 상황이라 그것도 여의치 않을 듯 싶다...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이면 지족(知足)하겠다는 민족 정서의 이상인 한가위 추석이 지나면 가을은 결실(收藏)을 맺기에 분주할 것이다. 고추잠자리가 높이 날고, 코스모스가 황토 길가에 가을을 전송하여 송별의 꽃을 찬연히 피울 것이다.
기러기 울어 예는 하늘 구만리/ 바람이 서늘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며는/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박목월의 시 ‘이별의 노래’는 두 소절만 읊어도 구슬프다. 작곡가 김성태는 이 시에 애련한 멜로디를 실었다. 노래로 불러보면 시로 읽을 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 가야할 길은 구만리, 갈바람을 타고 강남으로 떠나는 기러기의 울음이 애잔하게 들려 오는 듯하다.
옛 사람들은 ‘봄날의 여자는 그립고 가을날의 선비는 슬프다(春女思 秋士悲)’고 하지 않았던가. 녹음이 지쳐 잎이 떨어지는 가을은 남녀 불문하고 쓸쓸한 심사를 불러일으킨다. 조락(凋落)의 계절이라 만물이 시든다. 잎이 가지를 떠나고, 달은 점점 땅에서 멀어지고, 벌레들은 숲을 헤치고 땅속으로 숨는다.
추강동래(秋降冬來)의 기미를 알아차려 기러기도 떠난다. 식솔을 거느리고 되돌아간다. 하늘 높이 나는 기러기 떼를 본 적이 있는가. 길고 긴 대열이다. 가야할 때를 알고 돌아서는 옛 사랑의 그림자가 아득하듯이 말이다. 그래서일까, 기러기는 이별의 정서와 통한다. 기러기 울어대는 박목월의 시도 회자정리(會者定離)의 세월의 무상함을 구슬피한 것이다.
기러기는 먼 길을 가며 동료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소리치며 응원을 한다고 한다. 그들의 울음은 날개 짓이 힘들어 지친 동료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응원가인 셈이다. 인간도 마땅히 응원가를 부르며 살아갈 일이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을의 격양가(擊壤歌)가 넘쳐나면 좋겠다.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